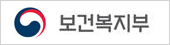- 종설(review article) 전문보기
-
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와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이미경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Research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viewMi-Kyung Lee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, Chung-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, Korea
의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인체유래물을 사용하여 왔다.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를 통하여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, 이를 질병의 예방 과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활용함으로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. 특히 최근의 유전체학, 단백질체학, 생물정보학 등의 발전 으로 인해 인체유래물은 의학을 포함한 관련 과학의 발전을 위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, 인체유래물의 사용에 대한 수 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. 이와 동시에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게 되는 연구대상자, 연구자,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 및 나아가 일반 사회에서도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.
우리나라에서 2004년 제정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」(이하 생명윤리법) 의 주요 목적은 “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, 생명과학기술이 인간 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· 이용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”에 있 었지만, 모든 연구가 아닌 인공수정배아 생성과 잔여배아 연구, 체세포복제배아, 유전자검사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인체유 래물연구(human materials research projects)에서 동의 절 차없이 인체유래물의 수집,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.
- Keyword :
- Human biological materials, Residual human biological materials, Institutional Review Board, Personal information
Journal of KAIRB 2024년 8월 6권2호 33 – 37